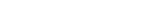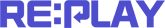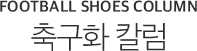[스포탈코리아] 홍의택 기자= 서울 동대문구 소재 열 평 남짓한 점포. 도심 열기를 식히려는 선풍기 바람에 본드 냄새가 떠다녔다. 정신이 없었다. 대화 사이사이로 그라인더 소리가 '위-잉' 지나갔다.
<신창축구화> 김봉학(55) 사장이 처음 신발을 만진 나이 열둘. 철공소를 떠나 대구의 한 신발 공장에서 축구화, 야구화, 육상화 등을 두루 취급했다. 빈주먹으로 상경한 뒤로는 스포츠용품의 메카로 통하던 동대문 운동장 앞에 눌러앉았다. 피와 땀으로 짜낸 번듯한 간판도 하나 내걸었다.
축구화 인생만 40년 이상. 강산이 네 번도 더 변했을 동안 이것 하나만 부여잡고 돌파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하냐'는 세간 평가에 그는 온몸으로 답해왔다.

그 시절 그 세대가 그랬듯, 넉넉지 못했다. 부모의 형편에 형제 대부분이 뿔뿔이 흩어졌다. 학교 교육은 언감생심. 앳된 티 가득한 얼굴로 생활 전선에 투입됐다. 눈썰미와 손재주가 괜찮다는 평가를 받으며 영역을 넓혀갔다.
돈이 남아나질 않았다. 조금 모았다 싶으면 갖가지 사고에 홀라당 날아갔다. 탈출구로 택한 서울행, 손에 쥔 돈 2,000원. 자장면 한 그릇에 차비로 끝이었다. 비빌 언덕도 없이 다시 시작했다. 손이 기억하고 있는 기술력을 믿었다. 본격적으로 축구화를 잡았다.
본인만의 작품도 욕심냈다. 당시 <교보문고>에 들러 책을 들춰보던 김 사장은 '브랜드'란 개념에 처음으로 눈을 떴다. 일례로 <삼성>처럼 그 역시 회사 네이밍을 원했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게 '내 것'이라는 의미의 'Mine'. 하지만 스포츠용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M사와 이미지가 겹친다는 데 발목을 잡혔다(하는 수 없이 김 사장은 Mine의 첫 'M'자를 산 모양으로 상형화해 축구화 뒤꿈치에 박기 시작했다).
고심 끝에 작명소도 드나들었다. 그곳에서 '신'발의 '창'을 수리한다는 뜻으로 <신창축구화>란 이름을 받아왔다. "머리 싸맨 보람도 없이 결국 남이 브랜드 붙여줬죠"라며 우스갯소리도 던졌다.

어쩌면 존재 자체가 위기였다. 거침없이 밀고 들어온 대규모 자본이 턱밑까지 압박했다. 이 흐름은 1986 서울 아시안게임 전후로 더욱 거세졌다. 신발이든 양복이든 소위 '메이커'란 공룡이 업계를 잠식해갔다. 개인 이름 내세워 분투했던 영세업자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김 사장은 그러지 못했다. 낮에는 신발 보따리 들고 조기축구회 전전하던 영업 사원, 밤에는 못 박고 미싱하던 제조업자. 그런 고된 삶에도 "당신 신발이 제일 좋아"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는 고객들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
사람마다 발이 다 다르다는 것은 진즉 깨쳤다. 그 덕에 해외 유명 브랜드의 등장에도 맞춤형을 고집하던 고객들을 맞을 수 있었다. 1년이든, 2년이든 일정 주기로 꾸준히 노크해왔다. 김 사장 역시 '하루에 하나만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장인 정신으로 무장했다. 옷깃에 밴 땀이 어느덧 가게 간판 속 '40년 전통 국내 유일 수제 축구화'란 문구로 남았다.

한때는 돈벌이도 꽤 했다.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들어오는 족족 투자비 명목으로 다시 내보냈다. 어느 가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볼이 달라붙는 감촉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수백 종의 축구화를 봐온 그는 연구를 거듭했다. 유명 브랜드 축구화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이에 줄기차게 도전했다. 하물며 탁구 라켓 판의 가죽을 축구화에 대기도 했다. 작은 공을 정교하게 다루는 탁구의 특성에서 힌트를 얻었다.
이번에는 돌기를 붙였다(상단 사진 참고). 흔히 '세무(섀미, chamois, 무두질한 염소나 양의 부드러운 가죽)'라 불리는 재료를 택했다. 이미 독일 A사 등 여러 업체에서 고무를 대는 방식으로 시도했으나, 살짝 방향을 틀어 접근했다. 공이 닿는 표면의 마찰력을 극대화해 회전을 주는 것이 기본 원리. 섀미를 뒤집어 발등 안쪽 가죽 위에 얹었다. 이렇게 <신창축구화>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했다.

"사장님, 터프화 말고 실내 풋살용으로 가능해요?". 대화 도중에도 손님들이 들락날락했다. "왜 안 돼. 여기 두고 가".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 손 잡고 매장을 찾았다던 한 청년은 대학 진학 후에도 축구 선수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여러 업체가 생겨났는데 왜 굳이 이곳을 고집하느냐 묻자, 가장 믿음직하단다.
이런 단골들의 존재에도 김 사장은 고민거리 한 아름이다. 소싯적 '우리 신발'이 세계 무대에 서는 모습도 그려봤으나, 이제는 고개를 숙였다. 대신 조금 더 소박한 꿈을 꾸기로 했다. 쉽사리 호전되지 않는 몸 상태, 이 일을 이어갈 후임자가 나타났으면 좋으리란 바람도 생겼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없어 속은 더 타들어 간다.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가격 경쟁도 격렬해졌다. 그럼에도 <신창축구화>는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일념이 굳건했다. 여기엔 김 사장이 쏟은 열정, 그리고 한 땀 한 땀 수놓은 인생이 빼곡히 들어찼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럴 순 없잖아요"라며 힘줘 말하던 것이 허언은 아니었다.
"단순히 몇 푼 더 벌려는 게 아니라, 일생을 바친 대가죠. 후회 같은 거 없어요. 대신 자부심이 있죠. 어디 가서든 '하자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을 만큼 철저히 만들어왔거든요."
사진=스포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