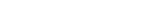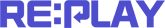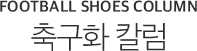축구를 잘하고 싶었다.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그라운드에 나서면 누구에게도 지기 싫었다. 독자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축구화도 발에 꼭 맞는 것을 신었다. 23살에 제대하면서 발에 ‘달라 붙는’ 축구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발이 조금 아파도 ‘곧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참아냈다. 몇 년이 지나자 안 그래도 못생긴 발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점점 모양이 바뀌더니 이제 정기적으로 빠진다.
20대 때는 그러려니 했다. 일종의 훈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좀 더 길게 축구 하려면 발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았다. 결정했다. 발과 밀착돼 숨쉬기 힘들 정도인 축구화 들을 과감히 벗어 던지기로 했다. 한 사이즈 큰 축구화가 처음에는 조금 헐거운듯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발에 더 이상 통증이 오지 않았다. 발이 숨을 쉬니 뛰기도 편해졌다.
이런 생각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 한국 국가대표팀 최강희 감독도 필자의 의견을 동의했다. 최 감독은 “선수 시절에는 255~260mm정도의 축구화를 신었다. 그야말로 발을 넣어서 축구화를 늘렸다. 그렇게 하다 보니 발이 많이 아팠다”라면서 “지금은 270~275mm를 신는다. 발이 정말 편하다. 이제는 축구화도 잘 나오고, 많이 늘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꽉 맞는 축구화를 신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
축구계에는 수많은 속설이 있다. 축구를 즐기는 동호인들도 많은 속설을 만들어내고, 또 따른다. 타당한 것도 있지만, 꼭 따를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 발에 꽉 끼는 축구화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선수들도 발에 꼭 맞는 축구화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이즈를 고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의 건강이다. 발이 아프지 않아야 더 오래 축구 할 수 있다. 더 오래 즐기고 싶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 30대 이상인 이들은 결단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발과 무릎이 망가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인조잔디에서는 터프화(TF)나 멀티그라운드(MG), 인조잔디용(AG) 스터드를 신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