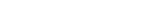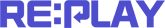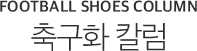[올댓부츠=오사카] 일본 주요 도시에 가면 심심치 않게 ‘카모(KAMO)’라는 이름의 ‘축구백화점’을 볼 수 있다. 전국 17개 매장에서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의 국가, 클럽팀 유니폼을 비롯해 수많은 종류의 축구화 그리고 관련용품들을 취급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카모에 없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할 수 있다.
카모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다. 1997년 ‘도쿄 대첩’ 당시에 일본 대표팀을 이끌다가 이민성의 한 방에 밀려 사퇴한 이가 카모 슈 감독이 생각난다. 카모는 카모 슈의 친 동생 카모 겐이 1968년 오사카에 처음으로 매장을 세운 이후 40년이 넘게 외길을 걸어왔다. 그 동안 매장은 17개로 늘었고, 연 매출 60억엔(약 900억 원)에 달하는 공룡기업이 됐다.
2011년 현재, 카모는 단순한 축구용품이 아니다. 4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축구의 모든 부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카모와 일본 제1의 에이전트사인 JSP,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인 SOL,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음식점 겸 바(bar)인 ESTADIO 그리고 축구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MARACANA가 카모그룹을 이루고 있다.
카모 겐 회장에 이어 카모 그룹의 서열 2위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요시노리 니시마타 부회장은 ‘스포탈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결을 살짝 밝혔다. 그는 선견지명과 포기하지 않는 뚝심 그리고 변화를 언급했다.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지면서 카모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뚝 섰다는 이야기였다.

“1968년 처음으로 매장을 세웠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어떻게 축구용품만 취급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축구만 해온 것이 오히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점이 됐다. 40년 동안 외길을 걸은 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대지진(2010년 11월) 이후 일본 경제가 침체기를 걷고 있는 순간에도 카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CRAFTSMAN’ 센터다. 축구화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 수선과 커스터마이징(취향에 맞도록 축구화를 변형하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줬다. 니시마타 부회장은 “이제 그저 파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욕구에 한 발 더 다가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카모의 명성은 일본 영토를 넘어섰다. 세계적인 용품사인 나이키와 아디다스 그리고 푸마는 모두 카모를 VIP로 대접하고 있다. 니시마타 부회장의 집무실에는 40주년을 기념해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보낸 선물이 진열돼 있다. 해외매장에 대한 요구도 있다. 홍콩은 카모의 입점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다. 철저하게 준비된 과거는 현재에 큰 힘과 가능성으로 살아날 수 있다. 카모는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파며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카모의 성공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한국 축구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형은 한국 축구에 눈물을 흘렸지만, 동생의 꿈은 한국에 영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