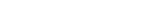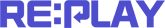초등학교 4학년 처음 축구를 시작했다. 그 때는 시장에서 파는 ‘보세’를 신었다. 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맨땅에서 몇 번만 차면 고무 뽕이 금방 닳았다. 형들의 ‘진짜’ 축구화가 내는 ‘딱! 딱!’ 소리가 부러워서 고무 뽕에 나사를 끼우고 다닌 적이 있다.
5학년 때에는 당시 큰 인기를 누렸던 서경 축구화를, 6학년 때부터 키카를 신고 본격적으로 브랜드 축구화를 접하기 시작했다. 키커는 당시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비싸지 않으면서 품질이 좋은 편이었다.
키카를 주로 신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푸마를 한번 신은 적이 있다. 삼촌께서 일본에 가서 일제 푸마 축구화를 사오셨다. 처음 신는 데 아주 좋고 이런 건 잘 못 느꼈다. 그런데 유명 축구화를 신었다는 기분 때문인지 첫 날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다. (웃음)
1994년 프로에 입문해서 1년 동안은 구단(울산)이 지급하는 축구화를 신었고, 1995년 다이너스티컵 국제축구대회 국가대표 경기부터 나이키가 국내에 들어와 계약을 맺고 '티엠포’를 신기 시작했다.
제품이 중국에서 들어온 탓에 지금처럼 품질이 좋지 못했다. 한번 신어도 축구화 가죽이 흐물흐물해졌다. 발 뒤꿈치도 쉽게 까졌다. 1996년도부터 이탈리아에서 만든 나이키 제품이 들어왔다. 이후에 몰라보게 좋아졌다. 우리 세대가 일종의 마루타였던 셈이다.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나이키 티엠포를 신고 뛰었고, 2002 한일 월드컵에선 나이키 토탈 90을 신었다. 까만 바탕에 은색 무늬가 들어간 축구화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키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축구화였던 것 같다. 나이키를 신고 좋은 성적을 얻었다.
무거운 걸 신어야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경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가벼운 걸 선호하는 선수가 있다. 나는 선수 시절 개인적으로 ‘토탈 90’과 같은 가벼운 축구화를 선호했다.
2002 월드컵을 마치고 나이키와 계약 조건 문제로 아디다스로 갈아 탔다. 이전부터 바꿔볼까 생각을 했었고 그때 아디다스가 홍보를 잘하기도 했다. 내 발 사이즈를 재서 딱 맞는 축구화를 신게 해줬고, 소위 '혓바닥'이라고 하는 텅(Tung) 부분에 내 이름과 번호를 새길 수 있었다. 이름은 ‘유비’라고 적었다.
※ 감독 유상철이 후배들에게 건네는 조언
요새 축구화를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가벼우면서도 기능이 너무 좋다. 코치들과 우스갯소리로 ‘선수 때 이런 거 신었으면 날라 다녔을 텐데’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발에 맞는 축구화를 신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기장에서 경기에 신경을 써야지 축구화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나도 아디다스로 바꾸고 나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멋도 좋지만 자신한테 맞는 신발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