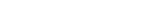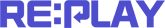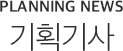#3. 소름 돋은 자블라니
축구공은 늘 매끈해야 할까. 그리 생각한다면 편견을 깨길 바란다. 자블라니는 미세한 특수 돌기가 가득하다. 어찌 보면 소름이 돋아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는 유로 2008 당시의 유로패스와 유로 2009의 피날레의 전통을 잇는 것이다. 당시 공인구에도 ‘구스 범프스’(GOOSE BUMPS), 즉 ‘소름’이 나 있어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 자블라니의 특수 돌기는 점(點) 형태가 아닌 일자형 돌기로서 한 걸음 진일보 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 돌기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선수들이 공을 더욱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축구공이든 축구화든 표면 마찰력이 높아질수록 공을 지배하기 쉽다. 특히 비가 오거나 그라운드가 젖어 있는 상황이면 특수 돌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어가 킥을 할 때나 골키퍼가 공을 잡을 때 미끄러질 일이 없다.
공 표면의 홈도 인상적이다. 패널(조각)의 표면마다 공기 홈이 있어 공 전체를 둥글게 감싸는데, 아디다스 측에 따르면 “최적의 공기 역학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목표 지점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슈팅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한국대표팀 선수들에 앞서 자블라니를 사용해본 신화용 포항 스틸러스 골키퍼는 “골키퍼들에게 까다로운 공이 될 것 같은데요”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4. 공의 불규칙성 줄였다
1970년 아디다스 공인구가 처음 나온 이래 패널(조각)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1970년 월드컵 공인구인 텔스타가 총 32개의 패널(12개의 검정 오각형과 20개의 하얀 육각형)로 이뤄졌다면 2006년 월드컵 공인구 팀가이스트는 모두 14개의 패널로 구성돼 무려 18개의 패널이 줄었다. 그런데 자블라니는 그보다 더 줄어든 8개의 패널로 만들어졌다. 복합 패널 4개와 삼각형 패널 4개가 그것. 한스 피터 뉘른베르크 아디다스 축구 하드웨어 개발팀 관계자는 “패널 수가 적을수록 공의 불규칙성이 줄어듭니다”라며 자블라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공의 안정성을 더한 한 가지. 완벽한 구체를 만들기 위해 애초부터 동그랗게 휘어진 모양의 패널로 공을 제작했다. 말하자면 납작한 패널을 휘게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덕분에 공의 어디를 차도 같은 회전과 힘을 가할 수 있게 됐고, 공은 날아가는 과정에서 보다 균형을 잘 유지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