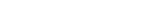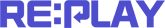"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이 축구화를 신고 시합을 못했어. 없었지. 5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운동화를 신고 시합을 했어. 그러다가 6학년 때 아버님이 축구화를 사주셨는데 시합을 못했어. 다른 아이들이 축구화 신어서 무섭다고 도망을 갔거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러다 중학교 때는 내가 운동을 안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때는 가죽창에 뽕(스터드)을 박은 축구화를 신었지. 당시에는 키카도 없었고 동대문 운동장에 있는 서경축구화나 정신축구화를 거의 다 신었지. 수제화였어. 괜찮았냐고? 괜찮지 않지. 맨땅에서 축구를 하면 뽕에 박은 못이 발 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징걸이로 못을 박고 뛰었어. 예전 선수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추어 팀에서 뛸 때는 메이커 신발을 사든지 선배들한테 얻든지 그랬어. 그 때는 뭐든지 정말 귀했지. 선배한테 신발을 얻거나 원정 가서 구입하면 칫솔로 하얀 데를 닦고 애지중지 여겼어. 요즘은 널린 게 축구화라서 요즘 선수들은 장비에 대한 소중함은 좀 없는 것 같아.
내가 주로 신던 브랜드는 아식스하고 아디다스였는데, 아디다스는 발이 좀 베기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아식스를 많이 신었어. 당시에도 대표 선수들이 프로 스펙스와 계약하면 2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축구화도 많이 갖다 주긴 했었지.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스폰서도 없었고, 당시에는 에이전트도 없어서 구단에서 나오는 거 신었어. 아마 한 두 선수 정도 스폰서를 받았지.
좀 유난스러운 면이 있어서 남들은 한 시즌에 2~3켤레 신었는데, 난 12켤레 이상 축구화를 소비했어. 험하게 신었다고 해야 하나? 3~4번만 신어도 연습용으로 돌렸어. 축구화에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싫어했거든. 일본 원정이라도 가면 축구용품 사는데 찾아 다녔지. 근데 길을 모르니까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가는 거야. 한 2만엔 정도 나올 때도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지하철 타고 700엔에 돌아왔었어. 하하. 잘 알아보고 갈걸.
그러고 보면 지금 축구화는 좋아진 정도가 아니지. 스텔라와 에쿠스의 차이라고 해야 하나. 베기지도 않지, 물집도 안 잡히지, 길을 들일 필요도 없지. 예전에는 가죽이라서 260mm을 사서 265mm를 만들었다니까. 처음에는 발가락을 오므리고 신어서 늘렸던 거지. 그런데 이제는 가벼운 것도 있고, 묵직한 것도 있지. 뽕 모양도 여러 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진 거야."
류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