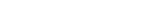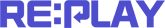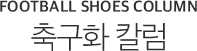두 번째 주제도 ‘축구화’가 아닌 신체 기관이다. 이번에는 축구 선수에게 두 번째 심장과도 같은 ‘발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발목은 수직으로 서 있는 다리와 수평으로 놓여있는 발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발을 이용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축구 선수들에게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발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면서 부상 위험이 가장 큰 기관이기도 하다. 그만큼 발목과 축구선수, 동호인들은 땔래야 땔 수 없는 ‘애증의 관계’로 얽혀 있다.

발목 부상을 잡아야 스트라이커가 뜬다!
볼을 다루는 화려한 기술일수록 발목을 꺾거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주는 둥 발목에 부담이 큰 움직임이 많다. 기본적으로 공을 드리블하는 동작도 한 발로 서 있는 불안정한 상태다. 계속해서 무리가 가는 상황에서 헤딩 경합을 위해 점프했다 떨어지는 동작, 발목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태클 등 한 순간만 균형을 잃어도 발목 부상이 발생한다. 그라운드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면 부상 위험은 더 커진다.
흔히 ‘발목을 삔다’고 표현되는 부상은 발목 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현상이다. 부상 이후 고통이 3일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완치되었다고 착각하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상 시 늘어나거나 끊어진 인대가 다시 붙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인대 손상을 피할 수 없다. 당장은 경기에 뛸 수 있지만 2~3년이 지난 후 후유증이 나타난다. 10년 이상 방치할 경우 관절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을지병원 족부정형외과 과장 이경태 교수는 축구전문 월간지 <포포투> 2008년 2월호에서 “대표팀에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커가 계속 없어지는 것은, 발목을 삔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아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선수들의 부상 관리가 발달한 축구 선진국의 경우 완벽한 치료로 순발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맞붙을 경우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선수 수명이 짧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력한 슛은 강력한 허벅지에 나온다. 순간적으로 강한 슛을 때리기 위해서는 단번에 큰 힘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달할 수 있는 힘의 양은 허벅지 근육의 크기와 직결된다. 순발력은 허벅지 근육의 양과 연관이 있다. 반면 유연한 발목은 남을 속이는 페인팅과 드리블 동작의 기본이 된다. 화려한 개인기를 펼쳐보이고 싶다면 발목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다.

즐거운 축구는 신체보호로부터
인체는 ‘작은 우주’라고 한다. 복잡성을 따질 수 없는 우주만큼이나 인체 역시 복잡한 구조와 원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일부분인 발과 발목 역시 특정한 기능과 작용, 관리법을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경태 박사는 “동작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이 계속되면 결국 (몸이) 망가지고 만다.” 뼈의 구조나 근육에 문제가 없는 동작을 해야지 일부러 어려운 동작을 하면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수라도 그라운드에서의 동작을 보면 ‘나중에 다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온다고 한다.
축구화는 물론 신가드와 앵클실드 등 발과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가능한 한 모두 갖추는 것이 좋다. 적절한 테이핑도 도움이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긴 하지만 인대와 근육을 제자리에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아무리 최첨단 보호장비라 해도 ‘보조 장비’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하고 행복한 축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내 몸을 알고, 아끼겠다는 마음가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