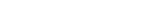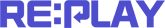| [국내축구] 아시아 최강 리그? '중국발 투자'에 장사 없다 | |
| 2015-12-08 / 추천 | Black593(leedo) |
|
[스포탈코리아] 홍의택 기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매번 당혹스럽다. 상황은 나날이 나빠진다. 익숙해지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도 없어 보인다. 이에 맞서려면 K리그도 돈다발을 풀어야 한다. 떠난 마음을 잡아두려면 선수가 납득할 수준으로는 맞출 능력이 돼야 한다. 그런데 여력이 없다. 모 기업 자금줄에 의존해 첫발을 내디딘 구조적 한계가 리그 창설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에야 튀어나왔다(뒤집어보면 중국의 강세도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돈을 쥐고 있는 자가 나타나면서 경쟁이 시작됐고, 값은 단순 투자라는 명목하에 감당할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적료로 또 다른 생존을 갈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말이 좋아 '셀링 리그'이지, 결국 선수 수급 탱크로 전락할 우려도 적지 않다. 네덜란드 리그든, 포르투갈 리그든 참고 케이스로 떠오르는 모델들은 대부분 주류로서 해당 대륙을 이끌어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적어도 아시아 왕좌를 다투려는 K리그에는 셀링 리그가 딱 들어맞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5년 연속 결승전에 진출하며 아시아 최강 리그를 자처해왔지만, 이 기세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다만 꺾이는 시점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고, 하향 곡선 역시 생각보다 가파르기에 당혹스러움이 배가 됐다. '몰락'이라는 단어는 적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훌륭한 선수가 존재하며, 탁월한 지도자를 보유한 리그다. 단, '최정상' 지위를 호령하기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